2008. 4. 1. 13:44 Day by day
그렇게 시작됐다.
따뜻한 캔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두 손이 어색해서 앞뒤로 흔들던 그 때. 전망대의 계단을 내려오며 대답 대신 내 팔짱을 꼈을 때, 놀란 마음에 나도 몰래 팔을 슬쩍 빼버렸던 그 때. 매번 문 밖과 문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인사를 하다가, 처음으로 같이 지하철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던 그 때.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감정들을 하루에 세 번이나 경험한 날.
그 날, 2008년 3월 30일. 이제 봄 이라고 불러도 좋을 3월 말. 떠나기 아쉬운 겨울이 여운을 남겨놓았는지. 아니면 오전 내내 내린 봄비 탓 이었는지. 아니면 낙산공원의 고지대 탓이었는지. 유난히 추운 날 이었다.
"그 날엔 꼭 이런 말을 해야지." 라고 마음 먹은 것이 일주일 전이었나? "이런 말을 이런식으로 멋지게 해야지." 라고 마음먹은 건 어제였나, 엊그제였나. 너와는 친구가 좋은지 애인이 좋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, 지금 우리 사이가 친구인지 애인인지 잘 모르는 어중간한 상태에서. 무엇인가 꼭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이유에는 별로 거창할 것도 없었다.
퇴근길, 버스에서 내리는 남녀 몇 쌍을 봤다. 내리자마자 남자의 팔짱을 끼는 여자. 내리자마자 여자의 손을 잡는 남자. 다들 꽤 비슷하다. 그런데 내리자마자 어색한 손을 어찌할 줄 몰라 주머니에 쑤셔 넣는 남자와 핸드백을 두 손에 꼭 쥐는 여자가 있다. 내리자마자 서로 약속이나 한 듯, 그 둘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어간다. 걷다 보면 손이 스치는 정도의 거리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한다. '오늘 소개팅을 했을까?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일까?'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분명 서로에 대한 호감이 보이는데, 아직 다가가지 못함의 아쉬움이 묻어난다. 문득 다른 사람의 눈에도 너와 난 그렇게 보이겠구나. 라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빨개졌다.
너와 걸을 때 손이 스치면 잡아주고 싶고, 너를 안아주고 싶고, 너의 얼굴을 잡아당겨주고 싶고, 너희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싶고, 네 귓가에 대고 속삭이고 싶고, 너에게 아이스크림도 떠먹여 주고 싶고, 문자메시지에는 하트도 넣어보고 싶고, 네 손 꼭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산에 오르고 싶었다. 친구에게는 어려운 이런 일들이, 연인에게는 너무 사소해서, 당연한 일이어서, 그래서 그랬나 보다. 그래서 이야기할 마음을 먹었나 보다.
낙산공원 제 3 전망대로 향하기 전 발견한 벤치는 봄비를 피해 지붕 밑에 들어가 있었다. 보란 듯이, ‘너에게 기회를 줄게.’ 라고 말하는 벤치에게, 그리고 곧 이 서울 땅 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 줄 벤치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다.
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었나. 떨리는 몸 때문이었는지, 아니면 얼어붙은 입 때문이었는지, 어쨌든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젯밤 수 없이 되뇌던 연습했던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.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감 없이 더듬더듬 대기는 싫었는데, 매번 좀 화나는 일이지만 이런 일에는 언제나 내 의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.

"네모난 노트 정 가운데에 선을 긋고, 각각 한 면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그려.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멋지게 고백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어. 내 얼굴은 벽 모서리에 바짝 붙어 있는데, 너는 끝도 보이지 않는 반대편 저 멀리 어딘가에 얼굴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지, 차라리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나을지도 모른다. 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을 즈음, 보라색이 된 너의 입술을 보고 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.
알고 있었을 거야. 그 무거운 분위기. 추운데,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, 아직 무엇인가 나오지 않아서, 들어야 할 말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,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자 생각 한거지? 그래서 유난히 추위를 잘 타는 네가, 그 찬바람을 맞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입술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일어나자는 말을 하지 않은거야. 아니라도 상관없어. 난 네 보랏빛 입술에서 "이제 그만 가자." 라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웠어.
"그만 가자." 라는 말을 하는 네게 "잠깐만." 을 외치며 허둥지둥 내 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. 네가 벽 반대편 저 멀리에 있다고 하더라도, "이제 연애하자." 라는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도, 단지 "그만 가자."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. 나에게 이야기 할 기회를 준 네가."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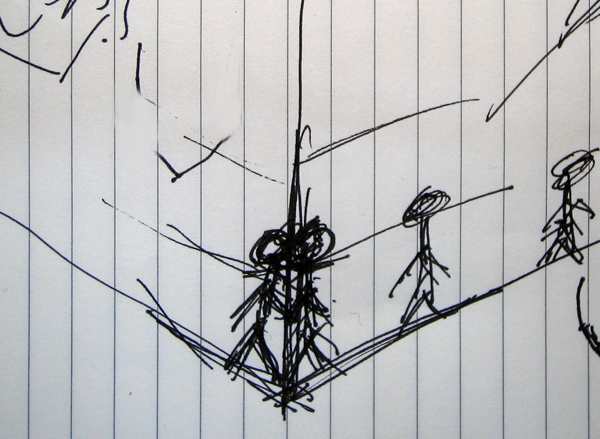
지하철이 들어올 때 날리는 차가운 바람에 뒤돌아 서며 널 기다리던 그 때. 가는 곳 마다 문닫은 음식점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원망의 눈길을 보내고 돌아오던 그 때. 칼 바람이 불어 내 건조한 눈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, 얇게 입은 옷 사이로 스며들어 체온을 앗아가던 그 때.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하루에 세번이나 경험한 날
그 날, 2008년 3월 30일. 이제 봄 이라고 부를 수 있는 3월 말. 점점 따뜻해지던 너의 그 두 손과, 서로 교차되어 있는 너와 나의 팔에서 느껴지는 온기. 그리고 지하철 안의 따뜻한 바람 덕분에 유난히 따뜻한 날 이었다.
'Day by day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다들 파이팅 입니다. (12) | 2008.05.07 |
|---|---|
| 운전이 너무 험하신거 아니에요? (8) | 2008.04.12 |
| 애인문답 ㅋ (14) | 2008.03.03 |
| 블로거 컨퍼런스 갑니다. (2) | 2008.03.01 |
| 2007년 블로그 통계 (22) | 2008.01.27 |

